한국인은 밥 심으로 살아간다. 이 말을 우스갯소리로 취급하며 거들떠보아선 안 된 다. 밥 먹었냐고 묻는 질문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인사치레가 되었다. 이 말은 ‘잘 살고 있니’, ‘그동안 별 탈 없었니?’처럼 여러 안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너는 어떻게 살고 싶냐 라는 누군가의 물음에 ‘잘 먹고 잘 살기’라고 쉬이 대답하지만 현실은 이 여섯 글자를 말하기나 글쓰기처럼 쉽지가 않다. 이를 알고 있음에 “밥 먹었나”가 입에 붙어 버린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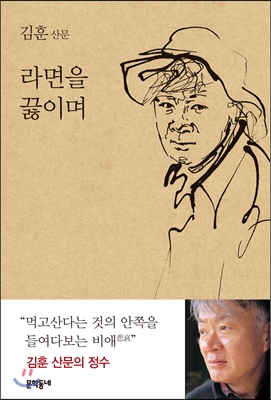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루를 살아가나? 에 대한 질문에 한참 고민할 필요는 없다. 김훈작가가 첫 장 제목으로 고른 것도 밥이지 않는가? 목구멍에 뜨거운 밥을 쑤셔 넣고 일자리를 향해 이른 아침 무거운 발걸음을 뗀다. 이는 또다시 내 목구멍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기 위하여, 또 배고픔을 채우기 위함이다.
부모님은 이른 아침부터 눈을 뜬다. 깨워주는 사람도 없다. 어쩌다 늦게 자는 날이 있더라도 해가 뜨기 전에 몸을 일으키고 나갈 채비를 미루지 않는다. 내 뱃속만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 부양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책임감으로 오롯이 살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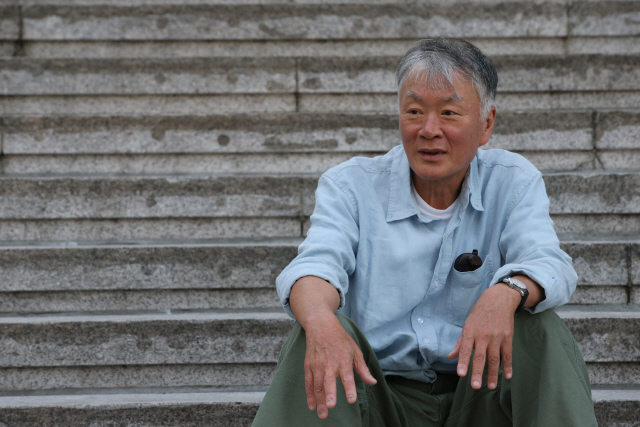
1960년대 초에 세상에 나온 라면은 현재에 와서도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다. 이 시대의 풍경, 질감과 닮아있다고 생각한 김훈작가는 제목을 <라면을 끓이며>로 지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소외되어있다. 이 고립된 대중 위에 거대한 자본의 전체주의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양극단의 풍경을 담아 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라면’ 이라는 것이다.
그가 이 책의 마지막에 “라면의 길은 아직 멀다.”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는 여전히 일상의 굴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 아닐까 싶다.
대책이 없다. 어찌할 도리가 없다. 어쩔 땐 다 놓아버리고 모른척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걸 밥벌이들은 누구 보다 잘 안다. 그래서 오늘도 묵묵하게 책임감이란 이름으로 또다시 거리를 나선다. 밥벌이의 지겨움과 고단함에 대해서 그는 허심탄회하면서 정성껏 눌러 써 내렸다. 밥벌이가 되기 전 읽은 입장에서 그들의 고충과 중압감과 규정할 수 없는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거리에서 싸고,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혼밥’이라는 단어도 이미 우리의 사회를 나타내는 단어로 자리 잡은 지 꽤 되었다. 식사 중에 나누던 정도 없어졌다. 밥 먹는 것이 수행해야 할 임무라도 되는 것 마냥 재빠르게 해결하곤 다시 일터로 돌아간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래, 먹고 살기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나. 끓고 있는 라면을 보며 멍하니 생각한다. 놀기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한다던 그 역시 밥벌이를 위해 얼마만큼의 라면을 끓여 먹었던가. 냄비가 넘치는 것을 보고서야 번뜩 정신이 들어 황급히 불을 끄는 김훈 작가의 모습이 떠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