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탄생>
내가 본 영화이고, 내가 쓰는 기사지만 사실 잘 모르겠다.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기사로 한 번 써봐야겠다고 느끼긴 했지만, 뭐라고 써야 할 지 막막했다. 그럴싸하게 꾸며서 써볼까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그건 솔직한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솔직하게 기사를 작성해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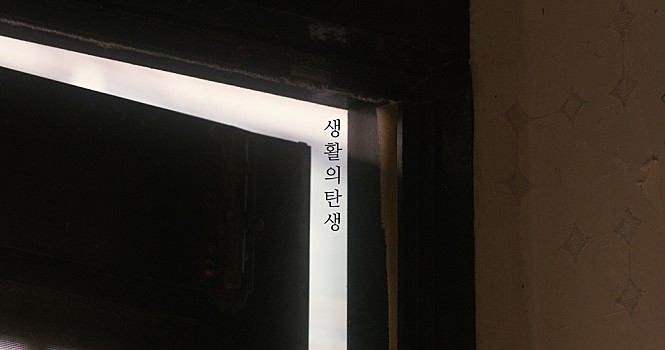
집 밖에서는 뽕짝 느낌이 강한 음악이 계속해서 들린다.
근데, 집 안에서의 느낌은 다르다.
젊은 남녀가 이사할 예정인 듯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사이즈를 재기도 한다.
그러면서 아주 무의미한 대화를 이어간다.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대화일까.
한가지 알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젊은 부부가 그 집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는 것.
다만,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탓인지 체념한 듯한 표정을 자주 엿볼 수 있었다.
마치, 현실에 순응하듯이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서울독립영화제 3일 차, 3개의 장편과 8개의 단편. 총 11편의 영화를 보면서 ‘이거다! ’싶은 것은 미리 내 느낌과 생각, 줄거리들을 따로 정리해둔다. 그런데 이 영화는 이거구나 싶긴 했지만, 사실 몇 줄 적지는 못했다. 마치 영화 속 내용처럼 답답하기도, 복잡하기도 했다.
오늘 접한 영화들이 어렵고 생각할 것이 많았던 영화임에 비해 비교적 즐기면서 보고 싶었던 섹션의 영화였는데 내 기대와는 조금 달랐던 영화이기도 하다.
최근 며칠 동안 하루에 10편이 넘는 영화들을 한 공간에서 본다는 것이 무척 피로하다는 생각을 한다. 2년 전, 이름 있는 영화제, 인연이 닿는 영화제를 돌며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하며 지내던 그때 맺은 인연들을 다시 ‘영화제’라는 공간에서 만나며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는다.
어린 동생을 친절히 대해주고, 멀리서 왔던 나를 반갑게 맞아주던 지인들이 여전히 건강히 지내는 모습에 감사함을, 자신의 자리에서 여전히 밝게 빛나는 분들을 보며 아낌없이 박수를 보낸다.
나 역시, 2년 전 ‘막내’가 아닌 누군가가 충분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라며,
시간이 흘러 다시 ‘영화제’에서 만난다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나의 지인들처럼 반짝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