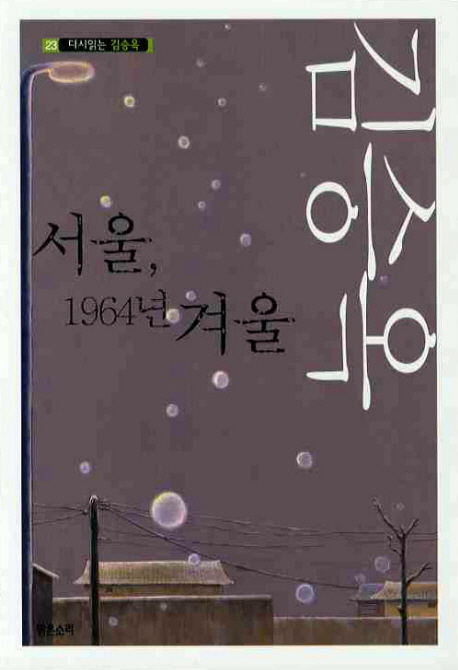
이 책은 현실에서 소외되고 목표를 잃은 세 사람이 선술집에서 우연하게 처음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잠시 거리를 떠돌다가 헤어지는 이야기이다. 현대 도시인의 자기 중심주의, 불소통 등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두 익명성을 지닌다.
특히 ‘안’과 ‘나’가 대화를 나누지만 각자 이야기만 풀어낼 뿐,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려 하지 않는다. ‘아저씨’의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에 별다른 안쓰러움과 안타까움 없이 형식적인 짧막한 조의만을 표현하며 위로하려는 기색은 전혀 없다.

돈만 있었더라면 사내의 아내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테지만, 돈이 없어 비참하게 아내는 죽어갔다. 여기에서 현재의 빈부격차 또한 1964년 겨울에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내의 시체까지 병원에 팔 수 밖에 없는 그의 심경은 차마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 이다. 그런 상황에 안타까움 없이 ‘안’과 ‘나’는 돈을 쓰도록 부추기며, 돈을 쓸수록 ‘맘씨 좋은 아저씨’라 칭하는 등 돈만 있으면 다 되는 물질만능주의의 폐해를 볼 수 있다.
또한, 혼자 있기 무서워하며 하룻밤만 함께 있어 달라 애원하는 아저씨의 부탁을 무시한다. 그의 죽음을 예상하면서도 그의 고독와 소외를 부담스러워 외면하는 모습을 보며, 어려운 부탁도 아닌데 주변인의 죽음에 이렇게까지 무신경해질 수 있을까 싶었다.
1960년대 군사 정권과 함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이웃집에 누가 사는 지도 모르던 시대,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시대에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에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며 주변인에게 점점 무신경해지는 모습이 과연 올바른 사회라 칭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다.


